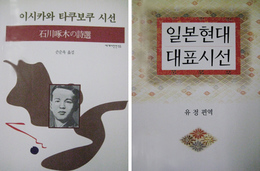| »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선〉· 〈일본현대대표시선〉(왼쪽부터) | |
| |
|
김연수의 새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문학과지성사, 2008)를 폭풍우에 떠내려가듯 읽었다. 강렬한 여운에 오래 갇혀 있고 싶었다. 시집을 들춰보기가 싫어졌다. 신간 시집 읽기를 포기하고, 소설에서 스치듯 언급된 시 한 편을 확인하기 위해 옛 시집을 편다. “내 친구는 낡은 가방을 열고/ 희미한 촛불이 흩어지는 마루 위에/ 여러 가지 책을 꺼내놓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이 나라에서 금지된 것들이었다.// 마침내, 내 친구는 사진 한 장을 찾아내어/ ‘이거야’ 하고 내 손에 얹어놓고는/ 조용히 또 창에 기대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쁘지도 않은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다.”(이시카와 다쿠보쿠, ‘낡은 가방을 열고’ 전문) 1886년에 태어나 26살의 나이로 요절한 시인이다. 백석이 그를 좋아해 이시카와(石川)의 ‘석’(石)을 제 이름으로 삼았다.
“그건 아리땁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옮기고 나서 김연수는 작중인물 니시무라의 입을 빌려 덧붙인다. “하나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뿐이니까. 그게 하나뿐이라면, 세상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래, ‘한’ 여자라는 것, 중요하다. 덧붙여, 금서(禁書)들이 상징하는 혁명의 열기 속에서도 한 남자로 하여금 휘파람을 불게 하는 것은 그저 사랑이라는 것, 너무 젊어 어설프고 순수한 이 사내들을 그러나 세상이 도와줄 것 같지가 않다는 것, 그게 이 시를 불안할 정도로 애틋하게 만든다는 것도 적어두자.
이시카와의 시를 오랜만에 읽고 일본 시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감회에 젖었다. 한때 애지중지했던 책 <일본현대대표시선>(창비, 1997)을 책장에서 꺼낸다. “누군가의 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노동자던가,/ 아니면 연극 대사였을까./ 어쨌든 스스로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은/ 이 말이 좋다,/ ‘막심, 어때?/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나.’// 옛날에, 난 갖고 있었지,/ 때 묻은 레인코트와 꿈을./ 내가 좋아한 소녀는 죽었다./ 난 직장에서 쫓겨났다./ 쫓겨나서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난 유치장에 들어갔다./ 들어갔더니 쇠창살 앞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어느 날, 난 강변에서/ 스스로를 격려했다./‘막심, 어때?/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나.’”
1911년에 태어나 ‘좌익 서정시파의 대표적 시인’으로 활동한 스가와라 가쓰미의 시 ‘막심’의 전반부다. 마저 읽자. “멍청한 세월에게 한 대 얻어맞고/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해고도, 감방도, 죽은 소녀도,/ 모두가 진짜였지./ 젊은 시절의 일들은 모두가 진짜였지./ 때 묻은 레인코트로 감싼/ 꿈도, 미래도…// 말해보렴,/ 만일에 젊은 자네가 고생을 한다면,/ 뭔가 제대로 안 돼서/ 스스로가 불쌍해지거든,/ 그때엔 좀 가슴을 펴고,/ 옛날의 나처럼 말해보렴,/‘막심, 어때?/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나.’” 10년 전의 나는 멍청한 세월에 한 대 얻어맞았다는 말, 젊은 시절의 일들은 모두가 진짜였다는 말들에 밑줄을 그었다. 슬픔을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슬픔과 희망을 온전히 전달하는 시.
사이토 마리코라는 시인이 있었다. 1960년에 태어나 1991년에 한국으로 건너온 그녀는 1993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어로 쓴 시집 <입국>(민음사, 1993)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다. “수업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겨울날 오후에는 옆자리 애랑 같이 내기하며 놀았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내기다. 창문 밖에서 풀풀 나는 눈송이 속에서 각자가 하나씩 눈송이를 뽑는다. 건너편 교실 저 창문 언저리에서 운명적으로 뽑힌 그 눈송이 하나만을 눈으로 줄곧 따라간다. 먼저 눈송이가 땅에 착지해버린 쪽이 지는 것이다. ‘정했어’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나도’ 하고 그 애도 말한다. 그 애가 뽑은 눈송이가 어느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지만 하여튼 제 것을 따라간다.” 시 ‘눈보라’의 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어진다.
“잠시 후 어느 쪽인가 말한다. ‘떨어졌어.’ ‘내가 이겼네.’ 또 하나가 말한다. 거짓말해도 절대 들킬 수 없는데 서로 속일 생각 하나 없이 선생님께 야단맞을 때까지 열중했었다. 놓치지 않도록. 딴 눈송이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다 집중시키고 따라가야 한다.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나는 한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났다. 아직도 눈보라 속 여전히 그 눈송이는 지상에 안 닿아 있다.” 여유 있고 사랑스럽게 이어지다가 “나는 한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났다”에서 뭉클해진다.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송이’에 온 마음을 다 내어주듯 그렇게 사람을 만났을 그녀가 안쓰러워서. 이 외국인의 한국어에서 위로받은 시절이 또한 있었다.
많이 읽지 못했으나, 내가 읽은 일본 시들은 이렇게 정갈하고 담백하였다. 찬미도 반성도 없이, 그저 손잡고 벚꽃길을 걸어가듯. 그저 창에 기대어 휘파람을 불거나, 스스로 제 어깨를 두드리거나,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를 좇아가면서 그렇게. 어떤 조심스러움, 겸허함, 혹은 예의바름 같은 것. 김연수의 소설 덕분에 다시 읽은 시들이다. 그러고 보면 이 시들은 김연수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말할 때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신뢰 혹은 희망 같은 것을 나눠 갖고 있다. 밤은 노래한다. 이 시들도 그 밤의 노래라고 하면 안 되나.
신형철 문학평론가